거리의 풍경, 패션 스타일,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수많은 것들이 변해간다. 음악 시장의 트렌드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즈음의 과거 K-POP 1세대 아이돌들의 음악과 지금의 음악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힙합, 하우스 장르 또한 음악 시장 트렌드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특색을 띠고 있다. 다음 글에서부터 음악 시장 트렌드에 관해 파헤쳐보도록 하자.
침체됐던 장르, 래칫의 부활
2010년대 힙합 문화 안에서 ‘래칫(Ratchet)’이라는 장르가 탄생되었던 바가 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하던 ‘Dj Mustard’가 래칫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냈다. 장르의 특징으로는 두 박자마다 ‘칫’ 혹은 ‘착’하는 소리가 나고, 주로 파티 느낌의 즐거운 분위기와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정열적인 분위기를 띈다. 우리나라에서 래칫을 활용한 대표적인 곡으로는 지코의 ‘Boys and Girls’과 박재범의 '몸매'가 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래칫’의 장르는 침체기를 맞이하게 됐고, 장르의 창시자인 'Dj Mustard'는 래칫을 힙합이 아닌 R&B에 활용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Ella Mai(엘라 마이)'라는 가수를 발굴해내 새로운 음악을 시도했고, 그녀의 대표곡으로는 ‘Trip’이 있으니 꼭 들어보기를 추천한다. 이후 침체기를 맞이했던 ‘래칫’ 장르는 2020년대 이후 카리나의 ‘Up’,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 도자 캣의 ‘Paint the town red’와 같은 메인스트림 반열에 오른 곡들에 사용되며 다시금 인기를 되찾고 있다.
오늘의 날씨는 비가 많이 내리고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멤피스 지역은 흐린 날씨가 잦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어둡고 우울하거나, 폭력적이라고도 느껴지는 가사를 쓰곤 한다. 기존에 대중들이 즐겨듣는 트랩(Trap) 음악에 악기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힙합 음악 중에서도 좀 더 공격적인 느낌을 띄는 곡이 많다. 202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미국 남부 힙합 음악시장의 수요가 매우 커져 '멤피스'라는 고유의 장르로서 자리잡고 있다.
흑인 소수민족들의 애환이 만들어낸 음악, 디스코&하우스
노래를 즐겨듣는 사람이라면 ‘하우스’라는 장르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에스파의 ‘Whiplash’와 르세라핌의 ‘Crazy’라는 노래에 차용된 장르로 이제는 대중음악에서도 활발히 들리는 장르다. 하우스 음악은 본래 뉴욕을 중심으로 흑인 소수민족들이 사랑하던 디스코 음악에서부터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유행하던 디스코 음악이 점차 인기를 잃어가던 중,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시카고의 웨어하우스(Warehouse)라는 클럽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프랭키 너클스(Frankie Knuckles)는 디스코 음악과 유럽의 전자 음악을 결합하여 음악을 틀었다. 사람들이 이곳 웨어하우스의 음악을 듣기 위해 찾아 모였고, 이곳에서 나오는 음악의 테이프를 구매하고 싶던 사람들이 ‘하우스 테이프 있어요?’라고 말하여 ‘하우스(House)’라는 이름으로 정의되기 시작됐다. 그렇게 시카고에서 시작된 ‘하우스(House)’라는 장르는 디트로이트로 넘어가 미래 지향적이고 높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지역 특성에 맞게 어두운 사운드를 결합하여 ‘테크노(Techno)’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이외에도 바다 건너 프랑스의 '다프트 펑크(Daft Funk)'의 실험적인 시도로 ‘누 디스코(Nu Disco)’라는 장르를 탄생시켰고, 미국의 ‘마시멜로(Marshmello)’와 ‘아비치(Avchii)’가 대중화에 앞서 EDM이라는 장르를 유행시켰다.
정석현 기자 kanaoo19@g.shing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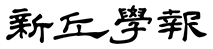




 즐겨찾기
즐겨찾기 모바일웹
모바일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