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 뚜뚜뚜- 뚜뚜- 뚜-’ 최근 여러 미디어에서도 다루고 있는 모스부호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자주 들어본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이 잘 없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치만 지금 이 시간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이번 글을 통해 모스부호란 무엇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다.
선과 점이 만난 모스부호, 그게 뭔데?
모스부호는 서로 떨어진 곳에서 전류, 전파를 이용해 약속된 신호를 가지고 정보를 주고 받는 전신 통신에 사용되는 부호로 미국인 ‘새뮤얼 모스’와 그의 파트너인 ‘알프레드 베일’에 의해 고안됐다. ‘새뮤얼 모스’의 이름을 딴 모스부호는 짧은 발신 전류인 점(.)과 비교적 긴 발신 전류인 선(-)의 조합으로, 초기에는 숫자만을 전송할 계획이었지만 베일이 일반 문자, 특수문자 등을 포함해 확장시켜 일반화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스부호와 전신기의 상업화에는 제법 긴 시간이 걸렸고, 1844년이 돼서야 워싱턴~볼티모어 사이의 전신 연락을 시초로 활발히 사용됐다.
국제간 협정된 모스부호의 구성
보통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스부호는 로마자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로 구성돼 있다. 모스부호의 구성은 ‘선의 길이는 점의 세 배일 것’, ‘한 자를 형성하는 선과 점 사이의 간격은 1점과 같을 것’, ‘문자와 문자의 간격은 세 점과 같을 것’, ‘단어와 단어의 간격은 7점과 같을 것’으로 정해져 있다. 알파벳 26자와 숫자 10개로 이루어진 모스부호는 아래 표를 참고해보길 바란다.
드루와 드루와, 우리나라의 모스부호 도입
국제적으로 사용된 모스부호,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한국에 처음 모스부호가 도입된 것은 당시 일본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인재였던 김학우가 고종의 명령을 받아 일본으로 전신기술을 배우러 떠났고, 연구 끝에 최초의 국문 전신부호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 모스부호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정된 전신 규정인 ‘전보장정’의 문헌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전보장정에서 한글 전신부호의 모체로 채택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활용돼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군에서도 모스부호를 사용한다고?
모스부호는 무선 침묵(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통신 보안상의 이유로 동작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나 낮은 전력을 이용해 장거리 송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보안이 중요한 군에서 많이 활용됐다.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모스부호를 사용해 모든 전선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받아 지휘함으로써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현재는 예전만큼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해군 함정에서는 조타병/조타 부사관이 탐조등으로 모스부호를 이용, 발광신호로 송신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함정 간의 소통을 돕고 있다.
강미솔 기자 mhjs1129@g.shing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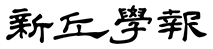




 즐겨찾기
즐겨찾기 모바일웹
모바일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