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에로스적 사랑과 플라토닉 사랑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며 에로틱한 사랑은 저열하고 아가페적 사랑만이 고귀하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 기사는 그저, 플라토닉에 대한 이야기다. 플라토닉 사랑은 어떤 형태일까? 단순히 육체적 접촉이 없다면 해당하는 걸까. 에로틱해도 닿지만 않는다면 플라토닉인 걸까. 영화 ‘Her’는 그 사람의 살 곁에 닿을 수도, 품 안 가득 안을 수도 없는 정신적, 혹은 비육체적 사랑 이야기이다.
마음을 대필해 드립니다. (feat. 2013년에 예상한 2025년)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는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로, 아내(루니 마라)와 별거 중이다.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 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스칼렛 요한슨)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해 주는 사만다로 인해 조금씩 행복을 되찾기 시작한 테오도르는 점점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당신이 하는 사랑은 어떤 형태의 사랑인가요?
테오도르는 스마트폰에서 출력되는 컴퓨터가 생성한 음성으로 사만다와 소통한다. 스마트폰의 음성 신호가 테오도르와 인공지능 사만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 장치 사이에서 정보나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의 접점이나 경계면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입이 ‘좋아해’라고 소리치면 청각이 신호를 받는 원리 또한 인터페이스와 같다. 곧, 우리는 시청각과 촉감의 인터페이스 연결을 통한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각적 대화가 가능한 테오도르와 사만다의 교감도 사랑에 해당하는 걸까?
보편적 사랑의 정의
AI와의 교감을 사랑이 아니라 하는 이들은 보편적 사랑에 대한 그들만의 정의가 있다. 영화 속에서 하나의 OS에 다수가 연결돼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1 대 1 적 사랑을 하는 이들에게는 반감을 일으킨다. 신체가 없는 인공지능으로 에로스적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만다의 사랑은 알고리즘과 학습에 의해 이뤄지며 본인이라는 주체가 없다는 점 또한 그들은 납득할 수 없다. 사람은 생물학•철학•종교•문화 등 여러 관점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모든 정의는 AI의 체계와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사만다는 테오도르와 대화하는 동시에 8,316명과 대화를 하고, 그중 641명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한다. 테오도르가 사만다에게 느낀 감정을 사랑이 아니었다 할 수 있을까? 사만다와 걸으며 대화하면 흘러나오는 웃음은?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속삭이던 대화들은? 정말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영화 속 명대사
▶“Falling in love is a crazy thing to do, It's like a socially acceptable form of insanity”:사랑에 빠지면 다 미치게 돼. 사랑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미친 짓이거든.
▶“Whatever someone you become, and wherever you are in the world, I'm sending you love”:당신이 누가 되건, 당신이 어디에 있건. 사랑을 보낸다!
▶ “We're only here briefly. And while I'm here, I wanna allow myself joy”: 우리는 여기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잠깐, 그리고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나 스스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신서현 기자 mareavium@g.shing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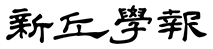




 즐겨찾기
즐겨찾기 모바일웹
모바일웹